 |
| 국내에는 페루의 여행지로 마추픽추만 알려져 있지만, 그 못지않은 명소들이 곳곳에 있다. 페루 중남부 태평양 연안의 샌프란시스코 사막. 끝 간 데 없이 펼쳐진 사막을 바람이 지나가면서 모래 위에 빚은 결들이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 이런 사막에서는 사륜구동 차량을 이용한 투어와 함께 급경사의 모래사구에서 스노보드를 타는 ‘샌드보딩’을 즐길 수도 있다. |
풍경 하나. 지구 반대편 남미 대륙의 페루. 안데스 고원의 티티카카 호수에 당도한 것은 늦은 밤이었습니다. 산맥의 구름 뒤로 마른 번개가 번쩍이는 캄캄한 비포장 길을 따라 몇 시간째 달려간 곳. 자그마치 해발고도 3810m. 산소마저 희박한 그곳에 거짓말처럼 거대한 담수호가 있었습니다. 그 밤에 티티카카 호반의 숙소 테라스에 나와 섰을 때였습니다.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거대한 돔형의 스크린 같은 밤하늘이 온통 황홀한 별로 가득했습니다. 끝 간 데 없이 펼쳐진 호수 위로 쏟아져 내리는 별들…. 믿을 수 없을 만치 아름다웠던, 그날의 밤하늘을 어찌 잊을 수 있을까요.
두번째 풍경은 태평양을 끼고 있는 페루 중부 해안의 막막한 사막에서 만났습니다. 와카치나 사구와 샌프란시스코 사막이 그려내는 끝없는 모래의 곡선은 유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황량한 사막 위의 바람이 제가 지나간 길 뒤로 물결 모양의 잔 발자국을 남긴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발자국이 그리는 선과 그림자가 그토록 아름답다는 걸 거기서 처음 알았습니다. 여기다가 사륜구동 차량으로 저물어가는 사막 한복판으로 들어가 텐트를 치고 즐겼던 한 끼의 식사의 낭만을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경험으로 보탭니다.
페루 중부 해안의 작은 섬 바예스타. 이른바 ‘작은 갈라파고스’라 부르는 곳에서 목격한 ‘살아있는 자연’을 페루에서 만난 세번째 풍경으로 꼽습니다. 둥근 아치 형상의 세 개의 바위섬에는 가마우지, 펠리칸, 펭귄, 물떼새 등 바닷새들이 무려 100만 마리나 머물고 있었습니다. 해안가에는 수천 마리에 이르는 바다사자들이 번식기를 앞두고 무리를 이루고 있더군요. 배를 타고 다가서면 바다사자들이 바위에서 물로 뛰어들었고, 물러서면 섬을 뒤덮은 바닷새의 무리들이 일제히 날아올랐습니다. 작은 섬에서 자연이 있는 그대로 숨 쉬고 있는 모습은 배의 난간을 붙들고 선 이들의 가슴을 벅차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구름을 이마에 두르고 있던 안데스 산맥의 위용을 마지막 풍경으로 꼽습니다. 그렇다고 안데스의 위용과 감동이 덜하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앞선 풍경들이 미처 알지 못했거나, 기대하지 않았다가 의표를 찔린 것들인 데 반해 안데스의 위용과 감동은 익히 기대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잉카제국의 ‘공중도시’라는 마추픽추가 그랬고, 잉카제국의 수도였던 쿠스코의 독특한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페루 여행의 아이콘으로 꼽히는 마추픽추는 기대가 컸지만, 거기에 당도해서 만난 풍경은 정확하게 그 기대만큼이었습니다. 잉카제국의 신전은 거대했고 그 험준한 산정에 만들어 놓은 도시는 말 그대로 ‘불가사의’, 그것이었습니다.
무릇 도전적인 여행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낯선 것들과의 충돌’입니다. 제 사는 곳의 형편과는 전혀 다른 광경을 만날 때 감동은 커지고, 사유 또한 깊어지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정반대인 남반구의 땅 페루는 낯선 풍경들로 가득한 완벽한 도전의 여행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익숙한 것들과의 충돌은 비단 풍경만은 아니었습니다.
지도 속의 추상으로만 존재했던 지구 뒤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만남은, 그것 그대로 경이였습니다. 페루의 수도 리마 외곽의 산꼭대기까지 올라간 빈민촌, 평생을 갈대로 띄운 호수 위의 네댓 평짜리 섬에 사는 수상가옥, 사방의 산군(山群)들이 벽처럼 솟아 있는 안데스 고산지역의 잉카 후예들의 남루한 삶…. 이들이 지구 반대편의 우리와 같은 시간을 공유하고 있다는 깨달음조차 모두 경이였습니다.
 |
| 안데스 고원의 티티카카 호수. 해발고도가 3810m로 전 세계의 뱃길이 있는 호수 중에서 가장 고도가 높은 호수다. 안데스의 빙하가 녹아 흘러내린 물이 가둬져 만들어진 호수는 하늘을 비춰내는 맑은 물빛이 가장 인상적이다. 티티카카 호수에서는 전통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원주민들을 찾아가는 투어를 즐길 수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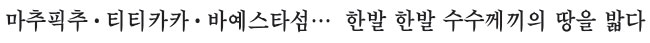 |
# 멀고도 낯선 지구 반대편의 땅, 페루
페루는 멀다. 비행시간만 갈아타는 시간까지 합쳐서 도합 서른 시간쯤이니 말 다했다. 물리적인 거리만큼이나 심리적인 거리도 못지않다.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잉카 유적 ‘마추픽추’나 ‘나스카’의 지상 그림 같은 수수께끼의 이미지로 가득한 곳들을 제외하면 우리에게 알려진 명소도 거의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 페루는 마추픽추로만 이해될 수 있는 여행지는 아니다. 여행 목적지로 페루는 한마디로 정의되지 않는다. 우선 기후부터가 그렇다. 페루에서 계절 구분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의미도 없다. 1년에 고작 1.5㎜ 남짓의 비가 내리는 사막의 땅이 있는가 하면, 축축한 습기로 휘감긴 열대우림이 있고, 해발고도 4000m를 오르내려 여행자들을 고산증(高山症)에 시달리게 하는 안데스의 고원지대도 있다. 지역과 기후마다 풍경과 삶의 모습이 어찌나 다른지 같은 나라라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멀고 낯설다는 건 곧 ‘호기심을 자극한다’는 뜻이다. 호기심이야말로 여행을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태평양의 바다를 마주하고 펼쳐진 거대한 태평양 연안의 사막도, 늘 머리에 흰 구름을 이고 있는 안데스 고원의 깎아지른 협곡도, 하늘을 담고 있는 고원의 거대한 호수도 모두 다 낯선 풍경들이다.
어디 이뿐일까. 도처에 펼쳐진 잉카문명의 유적도, 여전히 잉카의 전통을 지탱하고 사는 후예들의 삶도, 잉카 멸망 후 구축한 스페인 식민지풍의 경관도 모두 흥미롭다. 익숙함, 혹은 관성으로 지탱해 온 삶이 지루해진다면, 지구 반대편의 땅, 페루 땅에 가볼 일이다. 적잖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제를 다 빼고 무책임하게 제안한다면 그렇다. 같은 비용과 시간이 전제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여행지에 비교한다면 페루로의 여정은 다른 여행지를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얘기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