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일출 무렵 경주 문무대왕 수중릉이 정면으로 바라다보이는 봉길해변에 섰다.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밤을 새워 동해 용왕신에게 간절한 소망을 빌던 무속인들이 제를 지낸 음식을 해변의 백사장에 내려놓자 대왕암에 앉아 있던 갈매기떼가 일제히 날아올라 하늘을 뒤덮었다. 갈매기의 날갯짓에서 1300여 년 전 문무대왕의 장례에 펄럭였을 만장(輓章)이 언뜻 보이는 듯했다. |
왕이 승하했다. 681년 7월 1일의 일이었다. 신라의 문무왕. 16년 동안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 끝에 삼국통일을 이룬 왕이었다. 전쟁 속에 살았고, 전쟁이 끝났음에도 왜구의 위협에서 한시도 자유로울 수 없었던 왕이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왕의 마지막 유언이 이랬다.
“…목숨은 가고 이름만 남는 것이 예와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니, 홀연히 ‘긴 밤’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찌 한스럽겠는가.…지난날 만사를 처리하던 영웅도 마침내 한 무더기의 흙이 된다.…상례의 제도는 힘써 검소하고 절약함을 좇을 일이다.”
왕이 말한 ‘긴 밤’이란 짐작하다시피 ‘죽음’이었다. 왕은 그렇게 자신에게 다가올 ‘긴 밤’의 운명을 받아들였다. 통일의 위업을 달성했음에도 크고 화려한 무덤을 남기고자 하는 욕망은 없었다. 왕은 웅장한 무덤 대신 화장을 원했다. 남은 사람들에게 왕이 끝까지 당부했던 것은 백성의 부담경감과 검소한 장례였다. 위대한 왕의 가슴 뭉클한 유언이었다.
왕은 동해의 호국용이 되고자 했다. 통일은 이뤘으되 신라는 오랜 전쟁으로 국고는 탕진됐고 민생은 도탄에 빠져 있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끝낸 왕은 평화를 갈구했다. 전쟁에 쓰였던 투구와 무기를 녹여 농기구를 만들기도 했고, 더러는 모아서 무장산(?Y藏山)에 파묻고 평화의 세상을 기다렸다. 하지만 꿈은 멀었다. 기나긴 전쟁은 끝났지만 백성들은 지쳤고, 잦은 왜구의 노략질로 삶은 더 피폐해졌다.
왕이 신라를 지키는 용이 되고자 한 것은 이 때문이었을 것이었다. 비바람을 다스리는 거친 비늘의 용이 돼서 그 신령스러운 기운으로 신라를 지키며 평화의 세상으로 바꾸고자 했다. 죽어 용이 되고자 한다는 왕의 말에 법사가 물었다. “용은 한낱 짐승의 응보인데 어찌 용이 된다고 하시냐.” 왕이 답한다. “세상의 영화를 버린 지 오래이니 추한 응보로 짐승이 된다면 그거야말로 내 뜻에 맞는 일이다.” 삼국사기에 남아 있는 기록이 이렇다.
왕은 죽음의 긴 밤을 넘어 백성의 안녕을 지키는 용으로 다시 태어나 새 아침을 맞으려 했다. 죽어 용이 되고자 했던 꿈. 그것이야말로 죽음을 넘어서까지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왕의 마지막 소망이었다. 문무왕의 장례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시작한다.
 |
| 문무왕 장례행렬의 수레가 지나간 경주 함월산의 숲길에서 만난 용연폭포. 돌문 형상의 거대한 바위 안쪽에서 폭포가 쏟아졌다. 문무왕의 아들 신문왕이 수중릉을 찾았다가 동해 용에게서 만파식적과 옥으로 만든 허리띠를 받아 돌아오던 길. 신문왕이 여기서 옥대 한 조각을 물에 넣자 용이 돼 하늘로 올라가며 이 폭포가 만들어졌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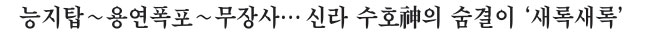 |
# 왕의 꿈, 한줌의 흙으로 돌아가다
삼국통일의 위업을 이룬 신라 문무왕의 죽음. 죽어서 용이 되고자 했던 왕의 장례행렬은 비장하고도 장엄했으리라. 1300여 년 전 그 행렬을 따라가는 여정은 경주 한복판 낭산(狼山)에서 출발한다.
왕이 승하한 지 열흘째 되던 날. 그러니까 681년 7월 11일의 일이었다. 왕의 시신은 성안의 침소에서 경주 남산과 마주보고 있는 낭산 자락으로 옮겨진다. 낭산은 경주 한복판에 남북으로 길게 누에고치처럼 누워 있는 해발 108m의 산이다. 높이와 위세만을 보면 ‘산’이라 이름하기조차 민망하지만 예로부터 신라는 낭산을 신성한 산으로 여겼다.
문무왕의 주검은 그의 유언대로 여기서 화장돼 한 줌의 재가 된다. 문무왕이 낭산에서 화장된 건 우연이 아니었다. 문무왕은 일찍이 이 산자락에다가 절집 ‘사천왕사’를 지었다. 삼국통일 후에도 물러가지 않고 신라를 위협하던 당나라를 불법으로 물리치기 위함이었다. 용맹스러운 사천왕을 모신 사천왕사에서는 적을 추풍낙엽처럼 물리치는 이른바 ‘문두루비법’의 신묘한 법회가 자주 열렸다.
문무왕의 화장은 사천왕사에서 머지않은 능지탑에서 이뤄졌다. 능지탑은 경주의 허다한 유적들에 밀려 찾는 이 없이 호젓한 민가의 구릉진 밭 주변에 덩그러니 세워진 높이 4.5m 정도의 건축물. 허물어진 석물을 다시 쌓아두었지만 본래 모습을 알 수 없어 2단만 쌓아두고 나머지 돌은 그 곁에 모아두었다. 왕의 죽음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간 흔적이 거기 있다.
능지탑은 생각보다 규모가 컸다. 정방형의 탑 주변을 돌며 사방의 석물에 돋을새김된 십이지신상을 둘러보다가 걸음의 수로 그 크기를 가늠해본다. 한쪽 면이 열여섯 걸음. 이게 만일 오층탑으로 서 있었다면 통일신라의 가장 큰 석탑이라는 감은사지 석탑 규모의 두 배는 넉넉히 됐을 것이었다.
몇 발짝 물러서 능지탑을 본다. 화장의 예가 치러지기 사흘 전 왕위를 물려받은 아들 신문왕도 아마 이쯤에서 선왕의 주검이 화염에 휩싸여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을 것이었다.
그렇게 문무왕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봤던 아들 신문왕도 훗날 능지탑에서 머지않은 이곳 낭산자락에 묻혔다. 능지탑을 찾았다면 신문왕릉과 사천왕사터를 함께 둘러보자. 여기다가 사천왕사터 위쪽의 선덕왕릉까지를 묶어서 가볍게 걸어서 다 돌아볼 수 있다. 수년째 발굴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사천왕사터에는 거북 모양의 비석 받침돌만 목이 잘린 채 덩그러니 남아 있다.
거북받침돌이 받치고 섰던 문무왕 비석 조각은 무너지고 쪼개져 국립경주박물관에 남아 있으니 장례행렬을 따라가는 여정의 맨 마지막 코스로 남겨두자.
 |
| 경주 낭산 자락의 능지탑. 문무왕의 주검이 열흘 만에 여기로 옮겨져 화장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