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만물상’이란 이름 그대로 하나하나 닮은 사물의 이름을 붙여줄 수 있을 것 같은 가야산의 암봉들. 그 위용이 어찌나 거대한지 사진 한 장으로는 담아낼 수 없다. 만물상 한쪽의 일부분을 찍은 사진에서 암봉 위를 건너가는 등산객과 비교해 보면 그 규모를 짐작해 볼 수 있다. |
1700여 년 전 낙동강 하류 일대에서 연맹국가를 이루고 있던 강성했던 고대왕국 ‘가야’. 그 땅이 뿜어내는 기운의 중심에 섰습니다. 경북 성주의 가야산. 가야산은 해인사와 홍류동이 있는 경남 합천 쪽으로, 또 경북 성주 쪽으로도 능선을 뻗고 있지만 그 기운을 제대로 느끼자면 성주 쪽에서 올라서 ‘만물상’을 딛고 서야 합니다.
바위들이 이름 그대로 ‘만물의 형상’을 하고 있는 곳. 검붉게 치솟은 거친 암봉들이 마치 아우성처럼 힘차게 달리는 자리에 서니 심장의 박동까지도 빨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백운동 쪽에서 오르자면 두루마리 그림을 펼친 듯 이어지는 가야산 암봉의 끝자락쯤에는 ‘상아덤’이 있습니다. 가야산의 여신(女神)과 하늘의 천신(天神)이 만났다는 성스러운 전설이 전해지는 암봉의 무리입니다. 가야산 여신은 정견모주(正見母主). 그 이름마저 반듯합니다. 그가 상아덤에서 백성들에게 살기 좋은 터전을 닦고자 밤낮없이 하늘에 소원을 빌었답니다.
이런 정성을 갸륵하게 여긴 하늘신 이비하(夷毗訶)가 오색구름을 타고 이곳 상아덤으로 내려옵니다. 산신과 천신은 이 자리에서 만나 부부의 연을 맺고 대가야의 이진아시왕과 금관가야의 수로왕을 낳았답니다. 신라말 최치원이 지은 ‘석순응전’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화려했던 단풍이 다 물러간 이즈음의 산하(山河)는 황량합니다. 이런 때 가야산을 찾아 오른 것은 나뭇잎이 다 떨어진 뒤에야 더 위용이 당당해지는 거친 암봉을 두르고 있어서이기도 했지만, 만물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겨울의 고요 속으로 들어가는 이즈음이라면 신화처럼 전해지는 가야왕국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여정이 맞춤하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가야산 아래 성주 땅의 성산가야의 고분에도, 이웃한 고령의 지산동 고분군과 대가야 유적에도 한때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다가 신라군의 기습으로 패망했던 가야왕국 시대의 이야기들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디 이뿐일까요. 성주에서 고령으로 흘러내리는 대가천 물길 곁에 무심한 듯 서있는 회연서원은 초겨울 낙엽으로 뒤덮여 적막한 아름다움을 뿜어내고 있었고, 조선시대 영남 사림파의 뿌리로 꼽히는 점필재 김종직 종택이 있는 고령의 개실마을도 고즈넉한 분위기가 그만이었습니다. 가야산의 만물상에서 시작한 발걸음을 성주와 고령까지 이으며, 이제는 다 스러지고 만 고대국가 전설의 흔적과 초겨울의 매혹적인 풍경을 길잡이 삼아 따라가봤습니다.
 |
| 경북 성주의 회연서원은 다른 계절도 못지않지만, 400년 된 느티나무가 내려놓은 낙엽이 서원 앞에 깔리는 늦가을부터 초겨울까지의 풍광이 가장 매혹적이다. 고즈넉한 분위기와 함께 앙상한 가지 사이로 서원 건물의 기와지붕이 그려내는 선도 아름답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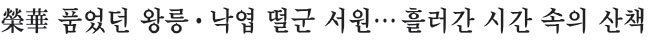 |
# 근육의 힘이 아닌, 풍광의 힘으로 오르는 길
자칫 가벼운 마음으로 여기에 발을 들여 놓았다가는 후회할지도 모르겠다. 가야산을 오르는 만물상 코스. 초입부터 만만찮다. 가파른 사면을 따라 한참을 올라 몇 번이고 숨이 턱에 차 멈춰선 뒤에야 겨우 암봉의 능선으로 올라서게 된다. 과거 가야산을 오르는 코스는 합천의 해인사 쪽이 유일했다. 그때 가야산을 올라봤다면 그다지 거칠지 않은 유순한 산으로 기억할 법하다. 그러나 국립공원 지정 후 무려 37년 만인 지난해 10월부터 ‘만물상 코스’가 개방되고부터는 사정은 달라졌다. 가파른 경사면을 따라 올라선 뒤 암봉을 타고 넘는 코스가 여간 힘들지 않기 때문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공원 내 탐방코스를 난이도에 따라 상, 중, 하로 구분하고 있다. 공단 직원들이 실제 산에 올라가 본 등산객들의 반응을 모아 점수를 매겨 난이도를 정한다. 전국의 국립공원 탐방코스 중 5㎞ 미만의 코스에서 난이도 ‘상’으로 분류된 곳은 모두 5곳. 그 중에서도 3㎞로 가장 짧으면서도 난이도 ‘상’으로 꼽힌 곳이 가야산 만물상 코스라니 이 정도면 말 다했다. 암봉의 능선에 올랐다고 해서 힘든 구간이 끝났다 생각하면 그거야말로 오산이다. 바위 틈을 통과하거나 거대한 암봉을 비켜 돌아가면서 오르내림이 끊임없이 반복된다.
하지만 가야산 만물상 코스는 주말이나 휴일이면 탐방객들이 전국 각지에서 구름처럼 몰려든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백운동탐방지원센터 직원은 “한창 단풍이 물들던 지난 가을에는 한꺼번에 몰려든 산행객들로 정체가 빚어졌을 정도”라고 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만물상’이란 이름답게 기기묘묘하게 솟은 우람한 암봉의 빼어난 풍광이 팍팍해진 허벅지나 몰아쉬는 가쁜 숨쯤은 잊게 만들기 때문이다. 아슬아슬 솟아있는 암봉을 하나씩 타고 넘을 때마다 탐방객들 사이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온다. 오름길의 끄트머리에서 다리 쉼을 하노라면 주변에서 “거참, 명산이네…명산이야”하는 찬탄쯤은 쉽게 들을 수 있다. 그러니 가야산에서 산행객의 발길을 이끌고 가는 것은 근육의 힘이 아니라 ‘장대한 풍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물상 암봉 끝자락의 상아덤을 지나 탐방코스의 갈림목인 서성대까지 당도하면 잠깐 망설이게 될지도 모르겠다. 멀리 올려다보이는 칠불봉과 우두봉의 정상을 밟고 가느냐, 아니면 이쯤에서 유순한 낙엽으로 뒤덮인 계곡길을 따라 나무덱을 딛고 내려가느냐…. 하지만 제가 올라섰던 만물상 일대를 한눈에 내려다보는 풍광이 기다리고 있는 정상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서성대에서 칠불봉까지는 1시간쯤이면 넉넉하고, 여기서 우두봉까지는 15분이면 된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